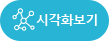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512 |
|---|---|
| 한자 | 武寧王陵石獸 |
| 영어의미역 | Stone Animal that Guarded Tomb of King Munyeong |
| 이칭/별칭 | 석수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웅진동 360]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 |
| 집필자 | 곽동석,정재윤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국립공주박물관에 있는 백제시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석조 동물상.
[개설]
무령왕릉 석수 는 발굴 당시 널길의 중앙에 밖을 향해 놓여 있어서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유물이다. 무덤을 수호하는 의미를 갖는 진묘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진묘수는 기괴한 형태의 상상 속의 동물로, 무덤 안이나 앞에 놓아 악귀를 쫓고 죽은 자를 지킨다는 중국의 묘장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석수 역시 악귀를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릉 석수는 1974년 7월 9일 국보 제16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형태]
무덤의 주인공을 지켜야만 하는 진묘수는 대체로 기괴한 형태의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상상 속 동물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진묘수는 맹수의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는 등 완전한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무령왕릉 석수는 좀 다르다. 일단 몸의 양 옆면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입과 코는 뭉툭하고 눈은 불거졌으며 귀가 작다. 몸통은 통통하고 다리가 짧은 편이며, 등에는 도드라진 네 개의 갈기를 등 간격으로 새겼다. 네 개의 다리 위에도 도드라진 날개가 붙어 있는데, 발톱의 표현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오른쪽 뒷다리는 발견할 당시 이미 깨져 있었다. 뒷면 엉덩이 한가운데에는 꼬리가 붙어 있으며, 정수리에는 사슴뿔 모양의 쇠뿔이 박혀 있고, 입술에는 붉은색이 아직 남아 있다. 마치 한 마리의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특징]
무령왕릉 석수는 정수리에 사슴뿔 모양의 쇠뿔이 하나 박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뿔이 하나 달린 경우를 ‘독각 진묘수(獨角 鎭墓獸 , 무덤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뿔이 하나인 짐승의 석조 동물상)’ 라고 한다. 독각 진묘수는 죽은 이를 서왕모(西王母)에게 인도하여 영혼의 승선(昇仙)을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석수는 서왕모라는 도교적 저승 세계에 대한 인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의의와 평가]
무령왕릉 석수는 불거진 눈과 벌린 입으로 인해 해학적인 느낌이 든다. 따라서 남조의 진묘수를 참고하여 백제적으로 재창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령왕릉 석수는 무령왕을 곁에서 수호하는 것뿐 아니라 곁에서 사후 생활을 함께할 반려동물의 역할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백제문화제에서는 ‘수호신 진묘수 웅진을 밝히다’라는 부주제로 웅진 백제의 상징인 석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무령왕릉 석수가 지닌 이미지가 현대인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문화재대관』(충청남도, 1996)
- 국립공주박물관, 『백제 사마왕』(통천문화사, 2001)
- 『무령왕릉과 동아세아 문화: 무령왕릉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2001)
- 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4-백제생활관(사계절, 2002)
- 『국립공주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 2004)
-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돌베개, 2005)
- 이영훈·신광섭, 『고분미술』1-고구려·백제(솔, 2005)
- 『무령왕릉 학술대회』(국립공주박물관, 2006)
- 『무령왕릉 출토유물 분석보고서』Ⅱ(국립공주박물관, 2006)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미』(한길사, 2006)
- 『백제의 문물교류』(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 『백제의 미술』(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index.do)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무령왕릉 석수(武寧王陵 石獸)
- 국가유산청: 무령왕릉 석수(武寧王陵 石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