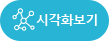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501 |
|---|---|
| 한자 | 武寧王陵誌石 |
| 영어의미역 | Stone Epitaphs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웅진동 360]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 |
| 집필자 | 서정석,정재윤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국립공주박물관에 있는 백제 시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2매의 명문석(銘文石).
[개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행적이나 무덤의 소재지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板石)이나 도판(陶板)을 말한다. 대개 본관과 이름, 조상의 계보, 태어난 날, 사망일, 행적, 가족 관계, 무덤의 소재와 방향 등이 기록되며, 무덤의 앞이나 옆에 묻는다. 이러한 지석은 묘지(墓誌)와 묘명(墓銘)으로 구분되는데, 묘지는 산문으로 된 것을 말하고, 묘명은 시로 읊은 운문을 말한다.
무령왕릉 지석은 모두 2매인데, 하나는 왕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비의 것이다. 지석 두 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도 입구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중 왕의 것은 앞면에 이름과 사망일, 안장한 날짜 등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천간(天干) 8자와 지지(地支) 9자가 새겨져 있다. 왕비의 것은 앞면에 사망일과 개장일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토왕·토백·토부모에게 땅을 사서 무령왕릉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령왕릉 지석은 1974년 7월 9일 국보 제163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형태]
두 점 모두 장방형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왕의 것은 세로 35㎝, 가로 41.5㎝, 두께 5㎝이고, 왕비의 것은 세로 35㎝, 가로 41.5㎝, 두께 4.7㎝로 거의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매의 지석에 중앙보다 약간 상단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제작 순서는 구멍의 형태를 볼 때 뒷면의 간지도(干支圖)를 먼저 작성한 후 무령왕릉 지석을 만든 후 매지권(買地券)을 2석의 뒷면에 작성하였고, 맨 마지막 왕비 지석이 2석의 앞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무령왕릉 지석에는 피장자의 이름[사마왕], 사망일[523년 5월 7일], 나이[62] 등은 있지만, 조상의 계보와 태어난 날, 행적 등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무령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태어난 날도 461년(개로왕 7)인지, 아니면 462년인지 알 수 없다. 행적에 대한 설명도 생략되어 있다.
왕비 또한 사망일[526년 12월]은 나와 있지만 이름, 조상의 계보, 나이, 태어난 날, 행적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더구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치아는 30대 여성의 것으로 밝혀져 더더욱 왕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더불어 지석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영동대장군’에 주목하여 무령왕이 중국의 선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의 왕들이 전쟁에 진 이유를 국가의 시스템 문제라 파악하여 한성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그 해답을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에서 찾았다고 보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무덤에서 지석이 출토된 것은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는 유일하다.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는 유일하게 피장자와 축조 시기가 밝혀짐으로써 백제 문화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다른 삼국시대 문물 연구시 비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아주 크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백제에서 송나라의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백제인의 내세관, 도교 사상, 백제의 상장(喪葬) 제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크다.
- 『한국의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1990)
- 권오영, 『무령왕릉』(돌베개, 2005)
- 이병도,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 대하여」(『학술원논문집』11, 1972)
- 임창순, 「매지권」(『무령왕릉』, 문화재관리국, 1974)
- 이은성, 「무령왕릉의 지석과 원가력법」(『동방학지』43, 1984)
- 성주탁·정구복, 「무령왕 지석의 해석에 대한 일고」(『송준호교수 정년기념논총』, 1987)
- 장철수, 「지석의 명칭과 종류에 대한 일고찰」(『두산 김택규 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1989)
- 장철수, 「지석의 발생에 대한 고찰」(『이두현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89)
- 강인구, 「무령왕릉의 장법과 묘제」(『백제 무령왕릉』,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 성주탁·정구복, 「무령왕릉 지석의 형태와 내용」(『백제 무령왕릉』, 1991)
- 이기동, 「무령왕릉 출토 지석과 백제사 연구의 신전개」(『백제문화』21, 1991)
- 이희관, 「무령왕 매지권을 통해 본 백제의 토지매매 문제」(『백제연구』27, 1997)
- 성주탁, 「무령왕릉 출토 지석」(『웅진도읍기의 백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007)
- 「무령왕릉 지석의 새로운 해석」(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지석 학술심포지엄, 2018)
- 국가유산청: 무령왕릉 지석(武寧王陵 誌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