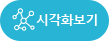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671 |
|---|---|
| 한자 | 就利山濟-羅會盟壇址 |
| 영어의미역 | The Alter for the League of Silla and Baekje at Chwirisan Mountain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 유형 | 유적/터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 |
| 집필자 | 양종국,박범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백제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의 회맹을 위해 취리산 정상부에 쌓은 제단의 터.
[개설]
당 고종은 웅진도독부 체제로 운영되는 백제가 영토를 유지하며 신라와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665년 8월 유인원의 주재로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이 화친의 맹약을 맺도록 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664년, 665년 2회에 걸친 회맹 기록이 발견되는데 이는 신라와 백제가 각각 계림대도독부와 웅진도독부가 되어 당의 도독부 지도 체제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라 회맹단지는 당 칙사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융, 문무왕 등이 모여 회맹한 장소이다. 회맹을 위해 웅진, 즉 지금의 공주에 있는 취리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백마를 잡아 맹약의 의식을 치른 뒤, 희생으로 쓰인 백마와 제물은 제단의 북쪽에 묻고 제문(祭文)은 신라의 종묘에 간직해 두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장소는 신라 문무왕과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의 화친 서약과 천제(天祭)가 이루어진 장소로 전한다.
[변천]
현상 유지 차원에서 당나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취리산 회맹은 백제나 신라 모두 만족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맹약은 곧 깨지고 양국간의 영토 다툼이 일어남으로써 회맹 장소 역시 방치되었고, 제단도 빠르게 훼손되었다. 웅진도독부가 한반도에서 쫓겨나고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을 거치는 사이 제단의 터는 물론 취리산의 존재 자체를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위치]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즉 예전의 공주농업고등학교 뒤편의 나지막한 산을 현재 취리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취리산 제·라회맹단지는 이 산의 정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경위 및 결과]
취리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공주의 연미산이나 취리산, 대전의 질티 등이 언급되지만, 웅진성에 와서 맹약을 맺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범위는 연미산과 취리산으로 좁혀진다. 특히나 두 산 모두 제·라 회맹이 있기 이전부터 유적이 존재했기에 두 산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취리산은 본래 난산(亂山)으로 지마현(只馬縣)에 있었는데, 부여융과 문무왕이 회맹함에 따라 취리산이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취리산은 옛 지리지에 제·라 회맹단지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지명 또한 취리산이기 때문에 현재의 취리산이 회맹단지라는 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실제 시굴 조사 결과 회맹지와 관련된 축단 시설이나 유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다.
2008년 시굴 조사에서는 연미산 정상부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었는데 ①해발 239m 산 정상에 석축 시설이 확인된 점, ②석축 시설이 백제시대 이전에도 유적이 존재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내부 민묘 등의 이유로 상면 안정층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연미산도 후보지로만 거론될 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연미산과 회맹 장소인 취리산이 서로 무관한 산이라고 나와 있다. 현재의 취리산은 원래 취미산, 또는 치미산으로 불려 왔다. 1955년 공주군이 발행한 『백제고도 공주의 명승고적』을 보면, 6·25 전쟁 당시 취리산 정상부에 판 참호 현장을 9·28 수복 즉시 답사했을 때 용이 그려진 장경병(長頸甁) 파편과 함께 산 아래 민가에서 백제토기 두 점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이 회맹 때 쓰인 술병으로 추측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997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취리산 발굴을 통해 다수의 백제 널무덤[토광묘]과 토기들을 찾아냄으로써 백제시대 흔적을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취리산 제·라회맹단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현황]
취리산 정상부에는 충청남도가 지적 측량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07년 12월에 설치해 놓은 지적 삼각점만이 있을 뿐 취리산 제·라회맹단지와 관련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의의와 평가]
취리산 부근에서 태어나 2008년 3월 19일 현재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 81세의 김정봉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는 갑옷과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골동품이 출토되어 엿장수에게 팔려 갔다고 한다.
취리산 회맹 이후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도 바뀌고 역사의 현장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뿌리 깊은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의도 갖고 있다. 회맹단지의 위치가 비정되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취리산의 위치가 밝혀지면 역사 기록을 구체화한 유적지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 『구당서(舊唐書)』
- 『백제고도 공주의 명승고적』(공주군, 1955)
- 『제·라회맹지 취리산』(공주대학교 박물관·공주시, 1998)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 양종국, 『중국 사료로 보는 백제』(서경, 2006)
- 이현숙, 「취리산유적의 고고학적 검토」(『선사와 고대』31, 한국고대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