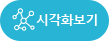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474 |
|---|---|
| 한자 | 公州牧 |
| 영어음역 | Gongjumok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 집필자 | 김갑동,박범 |
[정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고려 전기부터 조선 후기에 걸쳐 설치된 행정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고려 전기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5품 이상의 중앙 관리들로 하여금 봉사(封事)를 올려 좋은 정책을 건의하게 했는데, 그 중 최승로(崔承老)의 봉사가 채택되어 정책에 반영되었다. 최승로가 올린 시무 제28조 중 제7조는 전국의 주요 지역에 외관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983년(성종 2) 전국에 설치된 12목 중 하나가 공주목이다. 이후 공주는 목(牧)으로서의 지위를 조선 후기까지 유지하였다.
[내용]
당시 설치된 12목은 양주목·광주목·충주목·청주목·공주목·해주목·진주목·상주목·전주목·나주목·승주목·황주목 등이었다. 이들 행정구역에는 처음 주목(州牧)이란 외관이 파견되었으나 후에는 목사(牧使)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2목의 하나가 됨으로써 공주는 지방 통치의 거점이 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9주 중의 하나였던 위치를 고려에 와서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주목 아래에는 4개의 속군(屬郡)과 8개의 속현(屬縣)이 있었다. 속군은 덕은군·회덕군·부여군·연산군 등이었고, 속현은 시진현·진잠현·유성현·석성현·정산현·니산현·신풍현·덕진현 등이었다.
조선시대 공주목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계수관(界首官)이었다. 충청도의 목(牧)은 공주, 홍주, 충주, 청주뿐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지역의 주요 거점인 대읍(大邑)을 계수관으로 편성하여 주변 소읍을 통할하였다. 또한 세조(世祖) 연간 진관 체제에서도 계수관은 거진(巨鎭)의 수령으로 제진(諸鎭)의 군사를 통할하여 지휘하는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조선 전기 공주목에는 정3품인 목사 1인, 종5품인 판관(判官) 1인, 종6품인 교수(敎授) 1인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관리의 품계가 다를 수 있어서 정2품의 공주목사가 오면 영공주목사, 3품이면 판공주목사로 불렀으며, 1412년(태종 12)부터 정2품 이하는 판공주목사라고 지칭하였다.
[변천]
공주목은 995년(성종 14) 안절군절도사로 바뀌었다가 1018년(현종 9) 군으로 강등되었고, 1341년(충혜왕 2) 다시 목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공주목이 유지되어 충주·청주·홍주와 함께 충청도 4대 고을의 하나로, 차령산맥 이남의 중심지였으나 인조·현종·영조·정조 대에는 여러 차례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현으로 강등되었을 때에는 공산현(公山縣)이라고 지칭하였다. 별호는 회도(懷道)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편으로 공주군이 되면서 공주부(公州府)가 설치되어 27개 군을 관할했다가 1896년(고종 33) 13도제 실시로 충청남도 공주군이 되었다.
- 『고려사(高麗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갑동,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군현제 변화와 그 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30, 한국고대사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