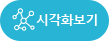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31009 |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 |
| 집필자 | 정재윤 |
[정의]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개설]
2015년 7월 5일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의 삼국 시대 백제 유적지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여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총 8개 유적이 대상이며, 공주에서는 공주 공산성(公州公山城),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武寧王陵-王陵園) 두 곳이 선정되었다. 부여에서는 부여 관북리 유적(扶餘官北里遺蹟)과 부여 부소산성(扶餘扶蘇山城), 부여 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 부여 나성(扶餘羅城), 부여 왕릉원(扶餘王陵園)이 포함되었다. 익산에서는 익산 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와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王宮里遺蹟) 두 곳이 등재되었다.
공주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기의 왕성으로, 산성이 왕성인 탁월한 가치가 인정받았는데, 큰 강을 끼고 있는 등 고대 수도로서의 보편성과 문화 교류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중국의 묘제와 장례, 일본산 금송, 동남아시아산 구슬 등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문화 교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 준다. 또 출토된 유물이 매우 뛰어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등재 기준에도 적합하다.
[산성이 왕성이네, 공주 공산성]
공주 공산성은 공주시 웅진로 280[금성동 65-3]에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의 남안에 있으며, 둘레 2,392m에 달하는 포곡식 산성이다.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불렸으며, 특히 웅진 시기에는 왕성이 자리하였다. 사비 시기에는 북방성의 역할을 하였으며, 동서 양성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양서(梁書)』 백제전에서는 백제의 도성을 ‘고마’, 즉 ‘곰’이라고 기술하여 웅진[고마나루]이 도성임을 확인해 준다. 사비 시기 기록인 『한원(翰苑)』에 따르면 웅진성은 5방(方) 중 하나인 북방성으로서 성의 길이가 1리 반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방의 길이를 계산하면 600m×4=2,400m이며, 이는 최근 실측된 2,392m와 일치하여 공산성이 백제시대와 면적이 일치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의 축조 방식은 동쪽 구간의 시굴과 무너진 구간의 보수를 할 때 백제시대 판축과 돌로 쌓은 구간이 존재하여 토성과 석성이 혼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백제시대 성의 존재가 확인되어 완전성도 갖추었다. 공산성은 백제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공주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여 준다.
공주 공산성[웅진성]이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475년 한성이 함락된 후 문주왕(文周王)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사이다. 이어 477년(문주왕 3)과 486년(동성왕 8) 두 차례에 걸쳐 왕궁을 수리(重修)하였다는 기사도 있다. 이의 해석을 놓고 연구자들은 왕궁이 천도 직후 공산성에 있었던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수리를 적극 해석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룬 후 시내로 옮겼다는 설도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추정 왕궁지 발굴 결과 최소 세 차례, 최대 여섯 차례의 중첩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수차례 수리한 것으로 본다면 공산성이 웅진 시기 전 기간에 걸쳐 왕성 역할을 한 것이 보다 명료해진다. 아울러 사비 시대 북방성의 역할을 하였을 때도 개축이 되었을 것이다.
왕궁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회랑형 주열 건물 터를 통해 공간이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궁지의 출입 시설은 남문인 진남루 부근에서 확인된다. 이는 500년(동성왕 22)에 기록된 궁궐 문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왕궁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쪽과 남서쪽 대지에서는 대규모 성토 작업을 통해 방형의 평탄 대지를 조성하였고 성벽 시설도 확인된다. 북쪽과 서쪽 사면 역시 2단의 성토 시설 등 외곽 시설을 두르고 있다. 또 서문인 금서루에서 왕궁지로 향하는 곳에 자리한 건물 터는 이를 통제하는 위병소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며, 북서 사면에 위치한 굴립주 건물 터는 성토 시설과 연결되어 이 역시 왕궁의 외곽을 경호하는 역할과 관련된 시설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왕궁지는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었던 것임을 보여 준다.
이 밖에 왕궁지에서는 목곽고(木槨庫)와 연지(蓮池)도 확인되었다. 유물 또한 와당과 삼족토기, 토제 벼루 편이 출토되어 위계가 높은 왕궁지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공산성의 서쪽 정상부에 평탄 지형을 조성하여 왕성이 위치한 것은 백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 도성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이다. 조망권을 배경으로 권위적인 건물 터를 조성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며, 방어에도 탁월한 부분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왕성이 강변에 위치한 점은 고대 수도의 보편적 현상이어서 공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 준다. 이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특출한 증거’에 해당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ⅲ)을 충족시킨다.
성안마을 유적에서는 80여 동의 굴립주 건물 터와 저수 시설, 공간을 나누는 도로 시설, 목곽고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저수 시설에서 645년(의자왕 4)의 당나라 옻칠 갑옷과 마갑이 출토되어 백제시대에 운영된 확실한 흔적을 보여 준다. 성안마을에서 왕궁지로 올라가는 능선에는 수혈 유구 100여 기가 발견되었는데, 저장공으로 추정된다. 영은사(靈隱寺) 앞에서는 백제시대 연못도 발굴되었다. 성안마을과 주변은 추정 왕궁지보다 3배 정도 넓은 공간이며, 여러 건물 터들이 발견된 점에 주목하여 왕궁 관련 부속 공간으로 보고 있다.
동쪽 봉우리 남사면에서는 5×6칸의 장방형 초석 건물 터가 주목된다. 이곳은 500년 궁 동쪽에 높이가 5장(丈)되는 임류각(臨流閣)을 세웠다는 기록과 방향상으로 일치하고, ‘유(流)’ 자 명 기와도 나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또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임류각은 왕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서쪽 봉우리에 자리한 왕궁과 대비되는 동쪽 봉우리 또한 왕성의 공간 구획을 나타내 준다.
공산성은 사비 천도 이후 북방성으로 편제되어 도성을 방어하는 북방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였고, 동서 양성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여전히 도성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다. 630년(무왕 31) 사비의 궁궐을 수리할 때 왕이 웅진성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왕궁지에서 초석 건물 터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백제 멸망 당시인 660년에 의자왕(義慈王)이 웅진성으로 피난한 것도 그 위상을 잘 드러내 준다.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당의 백제 지배 정책에 따라 처음 웅진성에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공산성이 백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과 아울러 호남과 경기 지역을 이어지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백제 이후에도 공산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주 지역에는 신라 9주의 하나인 웅천주의 치소가 있었으며, 822년(헌덕왕 14) 웅진도독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킬 때 공산성이 거점이 되었다. 김헌창의 난은 충청도·경기도·전라도 등 삼남이 호응할 정도로 대규모 반란이었으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공주의 정치적 중요성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 건물 터가 공산성에 축조된 것 역시 이러한 공산성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인조(仁祖)는 방어의 요지인 공산성으로 피난하였으며, 쌍수정사적비(雙樹亭事蹟碑)는 저간의 사정을 말해 준다. 고려 1011년(현종 2)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공주를 거치면서 당시 절도사였던 김은부(金殷傅)의 딸과 현종(顯宗) 사이에 덕종과 정종·문종이 출생한 것도 공주의 지리적 위치와 위상을 여전히 잘 나타내 준다. 조선시대에는 충청감영이 성 내부에 있었으며, 시내로 옮겨진 후에는 중군영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공산성은 백제뿐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 방어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공산성이 통시대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백제 문화의 탁월한 가치와 동아시아 교류의 증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공주시 왕릉로 37[웅진동 57-1] 일대에 있는 왕릉 묘역군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왕릉원은 송산(松山)의 남사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형이 마치 무덤의 주위를 감싸는 형세이다. 이는 한성 시기 평지에 자리 잡은 석촌동 왕릉 묘역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국 배후에 산봉우리가 있고 앞에는 평원이 있는 남북조시대의 풍수지리상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왕릉원 6호분 벽돌무덤에 그려진 「사신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석수[진묘수], 매지권, 청동거울 등 도교적 색채가 농후한 유물들은 이와 관련이 있는 표지이다. 공교롭게도 송산에 있는 무덤 또한 도성의 외곽에 해당하여 지형상 자연스럽게 도성과 왕릉을 구별하는데, 이는 중국식 도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분군의 배치는 동쪽 능선에 1~4호분이 있고, 서쪽 능선에 5·6호분과 29호분, 무령왕릉이 축조되었다. 서쪽 능선은 무령왕릉을 필두로 하여 무령왕계의 무덤이 위치하고, 동쪽 능선에는 무령왕(武寧王) 이전의 웅진 시기 왕과 가계의 인물들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쪽 능선의 정상부와 서쪽 능선의 하단부에 제의 시설이 자리하여 흥미롭다. A지구 제의 유적은 무령왕을 비롯한 무령왕계 소가계의 제사 유적으로 보이며, D지구 적석유구는 1~4호분의 위에 있어 제단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시공간적 배열은 난징[南京] 상산(象山)의 왕씨 가족묘 등 중국 남북조시대 귀족들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열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왕릉이 단독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집단으로 조영되었다는 것은 왕릉원의 독특한 차별성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과 5,235점의 유물을 통해 무덤의 주인공이 백제 25대 무령왕임을 확인한 것은 이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무령왕릉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벽돌무덤이다. 이에서 출토된 유물 중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단일 유적에서 대규모 국보가 출토된 것은 전무후무하다. 왕과 왕비의 관식과 뒤꽂이, 그리고 용무늬둥근고리칼은 지배자의 위엄을 나타내 준다. 반면 왕과 왕비의 금동 신발은 부장용품으로 제작된 위세품이다. 다리작은제팔찌와 흑유 목걸이, 9절 금제 목걸이, 은제 허리띠 장식은 탄성이 절로 나오는 장신구이다. 동탁 은잔에 사용된 공예 기술과 받침, 몸통, 뚜껑으로 구성된 구도는 백제의 대표적 금속 공예품인 백제금동대향로의 시원이 되는 빼어난 작품이다. 유리 동자상과 석수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이처럼 온전한 무령왕릉의 발굴과 이에서 출토된 유물은 베일에 싸인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기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고, 이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ⅲ)에 해당한다. 또한 양나라의 오수전, 청자와 등잔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 주는 유물이다. 이제까지 백제에서 볼 수 없었던 벽돌무덤의 축조는 중국과 교류하였다는 증거이며, 묘지석을 통해 27개월의 중국식 장제가 도입된 것도 이를 확인해 준다. 무령왕과 왕비의 관 재질은 일본산 금송이며, 수많은 구슬은 동남아시아산임이 밝혀졌다. 남북 420㎝, 동서 272㎝의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산 유물이 출토되어 동아시아 교류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ⅱ)를 충족시킨다.
왕릉원 6호분 역시 굴식 돌방무덤이며, 벽돌무덤이다. 특히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사신도」 벽화는 중국 혹은 고구려와의 교류를 보여 준다. 무덤 입구를 막은 폐쇄석 벽돌에서 ‘양관(선)와위사의(梁官(宣)瓦爲師矣)’가 새겨진 명문 벽돌이 나와 벽돌무덤에 양의 기술자가 간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최근 재발굴된 29호분에서도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 벽돌이 나와 당시 양나라 수도였던 건업[난징] 출신 기술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4호분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백제 고유의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도굴이 되어 유물의 실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투조과대(透彫銙板)는 신라 금관총 출토 허리띠 과판과 유사하여 두 나라의 교류를 보여 준다.
이처럼 무령왕릉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교류한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령왕의 대외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 먼저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여 521년(무령왕 21) 양나라 무제로부터 당대의 고구려 안장왕(安臧王)보다 높은 영동대장군백제사마왕(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이란 2품의 작호를 받아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섬진강 하구 항구인 대사[지금의 경상남도 하동 지역] 지역을 확보하여 왜로 가는 교역항을 확보했으며, 왜에 정기적으로 오경박사 등을 보내 우호를 다졌다. 무령왕릉에서 중국과 왜와의 교류를 보여 주는 유물이 나온 것은 이의 물적 증거이다.
이처럼 백제가 중국과 왜와의 교류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대립 시기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백제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백제화시켜 다시 일본열도로 전파해 준 것은 불교·유교·한자·율령 등 동아시아 공유 문화의 형성에 백제가 크게 기여하였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백제 문화는 단순히 한반도 서남부의 지역 문화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흐름과 변용을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유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유적은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 이남석, 『송산리 고분군』(공주시·공주대학교 박물관, 2010)
- 정재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백제문화』5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6)
- 정재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 방안」(『고구려발해연구』59, 고구려발해학회, 2017)
- 「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2023)
- 「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6차 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