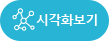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31026 |
|---|---|
| 한자 | 公州麻谷寺靈山殿木造七佛坐像-腹藏遺物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운암리 566-2]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박성신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6년 3월 10일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공주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 및 복장유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공주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 및 복장유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 현 소장처 | 마곡사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운암리 566-2] |
| 성격 | 불상|복장유물 |
| 재질 | 나무|종이 등 |
| 소유자 | 마곡사 |
| 관리자 | 마곡사 |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영산전에 봉안된 조선 후기 목조 불상과 복장유물.
[개설]
공주 마곡사 영산전에 봉안된 목조 칠불 좌상은 천불상의 주존불로는 현전하는 조선 후기 불상 중 유일하게 과거칠불(過去七佛)로 조성되어 있다. 목조 칠불 좌상 모두 나무로 제작한 팔각 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우측에 비바시불, 비사부불, 구나함모니불을 배치하였고, 좌측에는 가섭불과 구류손불, 시기불을 배치하였다. 공주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 및 복장유물(公州麻谷寺靈山殿木造七佛坐像-腹藏遺物)은 2016년 3월 1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위치]
공주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 및 복장유물 중 목조 칠불 좌상은 마곡사 남원 구역의 중심 전각인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다. 주변에는 매화당과 흥성루, 천왕문, 해탈문 등이 있다.
[특징]
목조 칠불 대부분이 네모진 방형 얼굴에 당당한 신체 비례를 보인다. 평면적인 얼굴 형태로 눈은 가늘고 옆으로 긴 편이며, 미관으로 이어지는 높은 코와 작은 입술로 위엄이 있으면서도 지긋한 미소를 띤 자비로운 모습이다. 육계(肉髻)는 높지 않은 편이며 일정하게 나열된 나발(螺髮), 반원형의 중간 계주(中間髻珠)와 원통형의 정상 계주(頂上髻珠)를 갖추었다.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어깨는 약간 앞으로 숙여 밑을 바라보는 시선은 칠불 모두의 공통적이다. 착의법은 중앙의 석가모니 불상을 예외하고 나머지 좌우 불상은 모두 안에 부견의(覆肩衣)를 입었다. 이로 인해 복부 앞에서 부견의와 대의(大衣)가 대칭으로 교차하여 둥근 ‘W’ 자 형태의 옷주름 표현이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마곡사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 칠불 좌상의 복장물을 조사한 바 있다. 복장물에서는 경전류[『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 등]와 후령통(候鈴筒), 그리고 조성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경전류는 대체로 조선 후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 발원문을 통해 1681년(숙종 7) 수조각승 단응(端應) 외 계천(戒天), 성환(性還), 탁밀(卓密), 학륜(學倫), 법청(法淸), 덕륜(德崙), 의수(義修), 민열(敏悅), 홍철(弘澈), 계정(戒淨), 경심(敬心), 의선(義禪), 해밀(海密), 태선(太禪), 체원(體元), 문신(文信), 해욱(海旭), 민성(旻性), 태민(太敏)이 참여했던 대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단응은 17세기 후반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각승이다. 수조각승 신분으로 처음 마곡사 영산전의 목조 칠불 좌상을 제작하였다. 영산전 목조 칠불 좌상은 과거칠불로 천불의 증명불로서 조성된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칠불의 도상과 형식은 단응에 의해 처음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단응의 불상 연구」(『미술사학연구』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 정은우,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과 천불의 조영과 가치」(『미술사연구』41, 미술사연구회, 2021)
- 고선영, 「17세기 후반 조각승 단응 불교조각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 허형욱, 「조선 후기 조각승 단응의 조상 활동과 성격에 관한 고찰」(『동악미술사학』32, 동악미술사학회, 2022)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