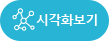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30004 |
|---|---|
| 한자 | 公州木梳匠 |
| 이칭/별칭 | 월소(月梳) |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장경희,박범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나무로 얼레빗을 만드는 장인과 그 활동.
[개설]
목소장(木梳匠)은 목소(木梳)를 만드는 장인(匠人)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빗인 얼레빗을 한자로 소(梳)라고 하였으므로 나무로 만든 얼래빗을 목소(木梳)라고 한 것이다. 즉 목소장이란 나무로 얼레빗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얼레빗은 길고 엉킨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머리 모양과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얼레빗을 만드는 목소장은 고려시대 어용(御用) 장식기구와 제작을 담당했던 중상서(中尙署)와 관아(官衙)에 관장(官匠)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경공장(京工匠)으로 각각 목소장 2명씩, 총 4명이 소속되어 있었고, 『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전록통고(典錄通考)』,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전율통보(典律通補)』 등에도 동일한 기록이 확인된다. 공조와 상의원에 소속된 목소장은 국가 및 왕실 행사에 필요한 얼레빗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 등 각종 의궤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남녀 모두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얼레빗은 일상 생활에서 수요가 많아 목소장도 다수 활약했다. 1895년(고종 32)에 단발령이 내려져 남자들이 상투를 잘랐고 해방 이후 여자들은 퍼머머리를 하면서 얼레빗의 수요도 줄어들었다.
특히 1960년대에 빗을 만드는 재료가 값싼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얼레빗을 만드는 장인은 거의 사라졌다. 공주 목소장은 2010년 7월 30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2호[보유자 이상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다.
[가계 및 전승]
목소장 이상근의 조부는 개화기 때 왕실 공방에서 활동했고, 부친 이은우도 얼레빗을 만들어 전통 얼레빗을 가업으로 이어온 장인 집안이다. 작은 빗과 빗접 등 소목가구들로 둘러싸인 공방에서 자라며 선친 일을 돕고 기술을 익혔다. 처음엔 소목일 전반을 다루다가 1982년부터 섬세한 조각에 매료되어 얼레빗 제작에만 매진하였다. 얼레빗의 재료가 되는 대추나무를 찾아 대추의 고향 충청남도 연산으로 왔다가 정착하여 공주 갑사 근처에 얼레빗 전수관을 짓고 전통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기술 내용]
목소는 빗살이 굵고 성긴 나무로 만든 얼레빗이며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월소라고도 한다. 얼레빗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80~100년 이상 되어 직경 10㎝ 정도 되는 대추나무를 추운 겨울 날 잘라 치밀한 결로 빗을 만든다. 그밖에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먹감나무 등 독성이 없는 유실수도 재료가 된다. 얼레빗은 가는 살 하나하나를 줄질하여 만들 수 있는 살잽이톱을 전용 도구로 사용하여 만든다.
전통 얼레빗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아무 조각을 하지 않아 담백한 맛을 내기도 하고, 전통 화각이나 옻칠 및 접목기법 등으로 화려하지만 번잡하지 않은 단아한 멋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애용하는 문양은 길상 문자나 화조 및 개구리 등 자연의 소재이거나 하회탈과 같이 전통 미술 속에서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목소장 이상근은 단절되다시피 한 전통 얼레빗을 복원하기 위해 옛 문헌과 유물들을 찾아 연구하여 사대부 층에서 주로 이용하던 대모빗, 조각빗, 장식빗, 주칠빗과 서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나무 반달빗, 면빗, 상투빗, 가리마빗, 살쩍밀이 등을 되살려 내었다.
[저술 및 작품]
얼레빗은 만드는 빗마다 나무의 종류나 크기, 형태와 문양, 장식이 달라서 완성된 모양도 모두 다르다. 목소장 이상근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23차례 수상하였고 1999년 제29회 ‘충청남도 공예대전’에서 얼레빗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내셔날 지오그래픽’에 얼레빗이 수록되었고, 2003년 ‘민족고유기능 전승자’로 선정되었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우수 공예품’ 인증서를 획득했다.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최영숙, 『충남 무형문화재 제42호 목소장』(민속원, 2011.)
- 『공주시지 2021』(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21)
- 공주 문화관광(https://tour.gongju.go.kr)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 국가유산청: 공주 목소장(公州 木梳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