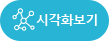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2029 |
|---|---|
| 한자 | 鷄龍百日酒 |
| 영어의미역 | Making Baegilju Local Alcohol of Gyeryong |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음식물/음식물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
| 집필자 | 김상보,박범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에서 만드는 술.
[개설]
밑술을 담그고 나서 덧술을 이차(二次)로 하여 순후한 맛이 나도록 빚어낸 가양주로, 익는 기간이 백일이 걸려 백일주라 한다. 여러 번 덧술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술을 단양법(單釀法) 술이라 하고, 밑술을 담고 나서 1차 덧술을 하여 단양법 술보다 알코올 도수를 올린 술을 이양법(二釀法) 술이라 한다.
밑술을 담그고 나서 2차 덧술을 하여 알코올 도수를 이양법 술보다 올린 술을 삼양법(三釀法) 술이라 한다. 삼양법 술은 술 가운데 특품(特品)을 가리킨다. 계룡백일주는 바로 이 특품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500년대 초 김유(金綏)[1481~1552]가 쓴 『수운잡방(需雲雜方)』에 삼해주(三亥酒)가 등장한다. 이 삼해주와 같은 방법으로 빚은 술을 백일주라고 하는데, 가양주로서의 백일주의 역사는, 술의 양조법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에는 삼해주(三亥酒)를 백일주라고도 하였다. 정월 첫 해일(亥日)에 시작하여 다음 달 해밀마다 덧술을 가하여 세 번 빚는다고 하여 춘주(春酒)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실록에 따르면 백일주가 황봉(黃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황봉은 황봉주(黃封酒)를 말하며 관청에서 빚어서 임금이 하사하는 궁중의 술이라고도 불린다.
계룡백일주 는 계룡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계룡산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므로 계룡산의 정기를 받은 술이라고도 하여 신선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다. 또한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성공한 인조가 반정공신 중 한 명인 연평부원군 이귀(李貴)에게 제조법을 하사하면서 후손이 이어받았다고도 한다. 지금도 연안이씨 가문에서 이를 전승하고 있다.
이 술은 『수운잡방』 이후 『음식지미방』(1670년경), 『시의전서(是議全書)』(1800년대 말),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1924)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드는 법]
정월 첫 해일(亥日)에 멥쌀 1말로 가루를 만들고 여기에 끓는 물 1말을 넣고 개어 죽을 만든다. 차게 식으면 누룩 5되와 밀가루 5되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둘째 해일에 멥쌀 9말을 가루로 만들어 무리떡을 만든 후 여기에 끓는 물 10말을 넣어 개어 죽으로 만든다.
죽이 차게 식으면 누룩 1말을 합하여 밑술에 섞는다(1차 덧술). 셋째 해일에 멥쌀 10말을 가루로 만들어 무리떡을 만든다. 여기에 끓는 물 10말을 넣어 개어서 죽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이것을 1차 덧술한 것에 넣는다(2차 덧술). 2차 덧술 후 30일 정도 지나면 익는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290번지에는, 연안이씨 이귀(李貴)의 14대손인 이횡(李鐄)의 부인 지복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 명인 제4호로 지정되어 16%, 30%, 40% 알코올 도수의 계룡백일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30%와 40% 알코올 도수의 술은 백일주로 만든 소주류이다. 찹쌀·멥쌀·누룩이 주재료이고 부재료로 솔잎·오미자·진달래꽃·국화꽃을 넣어 장기간 저온 숙성 발효시키고 있다.
- 김유, 『수운잡방(需雲雜方)』(1540)
- 『음식지미방』
- 『시의전서(是議全書)』(1800년대 말)
- 이용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수정서관, 1924)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룡백일주(鷄龍百日酒)
- 국가유산청: 계룡백일주(鷄龍百日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