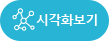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667 |
|---|---|
| 한자 | 班竹洞大通橋礎石 |
| 영어의미역 | Foundation Stone of Daetong Bridge in Banjuk-dong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적/유적(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 |
| 집필자 | 이왕기,박범 |
| 성격 | 석조물 |
|---|---|
| 양식 | 교각초석 |
| 건립시기/연도 | 백제시대 |
| 길이 | 100㎝ |
| 소재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
| 소유자 | 공주시 |
| 관리자 | 공주시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제민천 돌다리 교각 밑에 받쳐 두었던 초석.
[건립경위]
정확한 건립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원래 초석이 있던 자리가 대통사지(大通寺址)의 남동쪽으로, 인근에 당간지주가 있어 대통사로 통하는 다리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음 만든 시기는 대통사가 건립된 백제 때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527년(성왕 5) 신라 법흥왕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 황제였던 무제를 위해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백제 성왕이 대통불을 모시기 위해 창건한 사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찰명 이외에 대통사의 위치나 사세, 관련 기록 등은 거의 전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대통사지(大通寺址)에서는 교각의 초석 외에 약간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의 제작 방식이 중국 남조에서 유래되었고, 같은 양식의 기와가 신라 황룡사지, 일본 아스카테라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중국-백제-신라-일본의 네트워크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형태]
가로, 세로 각각 1m 정도의 화강석 위에 교각을 세울 수 있도록 치석을 해두었다. 모두 네 개가 남아 있다. 상부의 경우 평평한 방형 초석 가운데에 마름모꼴로 구멍을 파내고, 그 위에 교각을 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마름모꼴 구멍에 방형 교각을 세우면 물 흐르는 방향이 모서리가 향하게 됨으로써 급물살의 저항을 적게 받게 된다. 역학적인 구조를 고려한 석조 구조물이라 하겠다.
[의의와 평가]
백제 시기의 다리 구조물로, 그 사례가 흔치 않은 유물이다. 당시 백제 기술자가 다리의 여러 가지 역학적 문제를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백제의 기술적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라 하겠다.
- 『공주문화유적』(공주시·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 『문화유적분포지도』(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박물관, 1998)
- 『공주시지 2021』(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