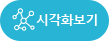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2601651 |
|---|---|
| 영어음역 | Matdure |
| 이칭/별칭 | 두레,고리박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물품·도구/물품·도구 |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
| 집필자 | 박진화 |
[정의]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서 함지나 물통 등의 네 귀퉁이에 줄을 매어 두 사람이 물을 푸는 농기구.
[개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물을 푸기 때문에 맞두레라고 한다. 맞두레는 글자 그대로 목판처럼 바닥이 좁고 위가 넓은 나무그릇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 두 사람이 두 줄씩 마주서서 잡고 호흡을 맞추면서 물을 떠올린다. 물이 깊이 고여서 두레나 용두레로는 물을 옮기기 어려운 데 쓴다. 물을 풀 때 한 사람이 ‘어리 하나’, ‘어리 둘’이라고 세면 다른 한 사람은 ‘올체’ 하고 받아서 장단을 맞춘다. 천 두레를 한 메기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백 두레를 한 메기로 잡기도 한다. 전라남도 보성 지역에서는 두레, 전라북도 봉동 지역에서는 고리박이라 한다.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는 한 메기의 물을 풀 때 천 두레에 다시 열 두레를 떠올린다. 마지막 열 두레는 그 집의 풍년을 기원하는 덤인 셈이다. 그러나 천 두레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999두레를 한 메기로 잡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관개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의 벽골지(碧骨池)나 제천의 의림지(義林池), 의성의 대제지(大提池), 상주의 공검지(恭儉池), 밀양의 수산제(守山堤) 등 저수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흐르는 물을 가로 막아서 물을 대는 방법인 보(洑)를 많이 이용하였다. 한편 낮은 곳의 물을 대기 위하여 두레, 용두레, 맞두레, 물풍구, 무자위, 홈통 등 기구에 의한 관개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물을 푸는 데 가장 많이 이용돼 온 연장은 맞두레와 용두레다.
맞두레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두레를 잡고 물을 푸는 것이고, 용두레는 장대로 삼각대를 설치한 후 그 꼭지에 두레를 매달아 한 사람이 물을 푸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동력 양수기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맞두레로 남자 두 사람이 하루에 깊이 1m 아래의 물을 1,000말가량 퍼냈다.
[형태]
나무나 양철로 목판처럼 만들어 네 줄을 단다. 나무통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생철통이나 헌 이남박을 대용하기도 한다. 나무두레의 무게는 1.5㎏ 내외이다.
- 『김제시사』 (김제시사편찬위원회, 1995)
- 농업박물관(http://www.agrimuseum.or.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맞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