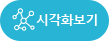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31021 |
|---|---|
| 한자 | 公州甲寺大寂殿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유물/불상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8-2[중장리 59]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박성신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3년 12월 20일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공주 갑사 대적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공주 갑사 대적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 현 소장처 | 갑사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8-2[중장리 59] |
| 성격 | 불상 |
| 재질 | 나무 |
| 소유자 | 갑사 |
| 관리자 | 갑사 |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갑사대적전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후기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
[개설]
공주 갑사 대적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公州甲寺大寂殿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은 중앙에 본존인 아미타불과 좌우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불상이다. 아미타불은 죽은 사람을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제한다는 부처이고, 관세음보살은 자비, 대세지보살은 중생 구제를 의미한다. 공주 갑사 대적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2013년 12월 2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특징]
본존인 아미타불은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손등이 위, 왼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여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관음보살 좌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U 자형의 관대가 서로 교차하며 바람에 날리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가슴에는 별도의 영락 장식을 하지 않았다. 치마인 군(裙) 위에는 복갑, 복갑 위에는 요의를 입었으며, 무릎에는 갑대가 표현되었다. 대세지보살도 가슴에 영락 장식을 하지 않고 손에는 관음보살상과 대칭으로 연꽃을 들었다. 삼존불 모두 무릎 밑으로 흘러내린 부채꼴 모양의 치마 주름은 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공주 갑사 대적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의 복장물은 거의 없어졌으나 1651년(효종 2) 신묘명(辛卯銘) 다라니가 몸 안에서 나와 상한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다라니는 불상의 제작 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약하지만 사찰의 중창 불사가 끝나고 세운 1659년(효종 10) 사적비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중창 불사 당시 불상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의의와 평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혜희(惠熙)의 작품과 착의법이 다른 두 협시 보살상, 복갑과 갑대를 찬 모습에 넓적하면서도 편평한 얼굴 표현, 당당한 자세 등에서 매우 비슷하다. 특히 혜희는 1655년(효종 6)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여래좌상을 조성한 화원으로 17세기 중엽쯤에 활동하였으며,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금산 보석사, 부여 대조사 등 충청도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 『공주시지 2021』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21)
- 한건택, 「17세기 충남지역 목조불상 연구」(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