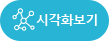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0749 |
|---|---|
| 한자 | 吳始壽 |
| 영어음역 | O Sisu |
| 영어의미역 | O Sisu |
| 이칭/별칭 | 덕이(德而),수촌(水邨)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고수연,박범 |
[정의]
조선 후기 충청남도 공주에서 활동한 문신.
[가계]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덕이(德而), 호는 수촌(水邨)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오정원(吳挺垣)이다. 오시수(吳始壽)[1632~1681]가 부친의 묘를 공주에 조성하면서 동복오씨 공주 입향조가 되었다
[활동사항]
오시수(吳始壽)는 1632년(인조 10)에 태어났다.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 합격했다. 1656년(효종 7)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가 되었고, 사간원정언·세자시강원문학·사헌부지평·교리·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664년(현종 5) 사복시정(司僕寺正)·평안도암행어사를 지냈으며, 사헌부집의·응교·의정부사인을 거쳐 1666년 중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예빈시정·승정원승지를 거쳐 1670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기근에 허덕이는 전라도 지방의 참상을 고발하였다.
오시수는 과거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그는 숙종 대 초 남인의 일파인 탁남 계열의 주요 인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숙종 즉위를 전후하여 허적을 비롯한 탁남 계열 인사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오시수는 여러 주요 직임을 역임하며 정국의 핵심 인사로 활약했다.
실제로 오시수는 승정원승지·예조참의·이조참의·평안도관찰사를 거쳐 1674년(현종 15) 승정원도승지가 되었다. 1675년 숙종이 즉위한 뒤 형조판서에 발탁된 데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고, 청나라 조제사(吊祭使)들이 돌아갈 때 반송사(伴送使)가 되었다. 1676년(숙종 2) 호조판서로 발탁되어 흉년에 대한 대응 마련에 주력했다. 그 이듬해에 오시수는 다시 사헌부대사헌·판의금부사·이조판서·예조판서를 지내고, 1679년(숙종 5)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당시 오시수는 허적과 함께 동전의 유통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1680년(숙종 6) 남인 세력이 실각하는 경신환국(庚申換局)이 발생함에 따라 오시수 역시 이에 연루되어 다른 남인들과 함께 유배되었다. 이후 오시수는 이듬해인 1681년(숙종 7)에 앞서 청나라 조제사가 왔을 때 왕에게 왕약신강설(王弱臣强說) 등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서인의 탄핵을 받고 사사되었다.
[저술 및 작품]
저서로는 『수촌집(水邨集)』이 있다. 『수촌집』은 부록 4권을 합쳐 총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2년 오시수의 후손인 오재순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오시수가 지은 시(詩), 서간(書簡)을 비롯해 각종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왕약신강설과 관련해 그가 결국 사사되기까지의 전말이 수록되어 있어 그 실상을 알려 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묘소]
오시수 묘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월굴마을 뒤 구릉에 있다. 묘소 앞에는 너비 66㎝·높이 140㎝·두께 39.5㎝의 묘비와 동자상, 망주석, 장군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묘소 앞에는 오백령(吳百齡)의 사우(祠宇)가 있다.
묘역에는 오시수 신도비 2기가 있다. 오른쪽 비는 1694년에 세워진 것으로 너비 124㎝·높이 243㎝·두께 54㎝의 규모로, 우의정 민암(閔黯)이 비문을 짓고 전주부윤 박경후(朴慶後)가 본문 글씨를 썼으며 대사간 이서우(李瑞雨)가 전서 글씨를 썼다. 왼쪽의 비는 1810년(순조 10)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 너비 55㎝·149㎝·두께 39.5㎝의 규모로, 장령 정종로(鄭宗魯)가 비문을 지었다.
[상훈과 추모]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복관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다시 삭직되었다. 1784년(정조 8)에 신원 요청으로 다시 복관되었다.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시수(吳始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