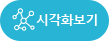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01701587 |
|---|---|
| 한자 | 申硈忠臣旌閭 |
| 영어의미역 | Memorial Monument for Sin Hal, the Loyalist |
| 분야 | 종교/유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적/건물 |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산28-1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고순영,박범 |
| 성격 | 정려 |
|---|---|
| 양식 | 맞배지붕 양식 |
| 건립시기/일시 | 1638년 |
| 정면칸수 | 1칸 |
| 측면칸수 | 1칸 |
| 소재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산28-1
|
| 소유자 | 신호철 외 3인 |
| 관리자 | 신호철 외 3인 |
| 문화재 지정번호 | 공주시 유형문화유산 |
| 문화재 지정일 | 1997년 6월 5일 |
| 문화재 지정일 | 2024년 5월 17일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에 있는 조선 중기의 충신 신할의 정려.
공주시청에서 백제큰다리를 건너 예산으로 가는 국도 32호선을 따라 약 19㎞를 가다 보면 신풍면과 사곡면의 경계에 들어서게 된다. 경계를 지나 다시 1.5㎞ 더 가면 냉정리와 영정리의 경계가 나오고, 마을 앞 버스 정류장에서 예산 쪽으로 100m정도 더 가면 도로 왼쪽으로 신할의 사적비가 보인다. 신할 충신 정려는 여기에서 왼쪽으로 난 소도로를 따라 30m 정도 더 들어간 곳에 있다.
신할(申硈)[1548~1592]의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중견(仲堅)이다.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19세손으로, 영의정 신화국(申華國)[1517~1578]과 첨정 윤양정의 딸 파평윤씨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진왜란 당시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왜적과 싸운 후 순국한 신립(申砬)[1546~1592]이 신할의 형이다. 신할은 1567년(명종 22) 무과에 급제하였고, 1589년(선조 22)에 경상도좌병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후에는 선조의 피난길[蒙塵]을 호위하였고, 경기수어사 겸 남병사로 임명되어 전쟁에 참여하였다. 임진강에서 9일 동안 왜적과 서로 마주 대하여 버티다가, 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과 함께 병력을 지원받아 방어 작전을 만들었다. 밤중에 적진을 공격하였지만, 복병이 있어 44세의 나이에 순절하였다.
신할 충신 정려는 임진왜란 당시 임진강 전투에서 순절한 충신 신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원래는 1638년(인조 16)에 명정을 받고 서울시 상도동에 건립되었으나, 1982년 상도동의 도시 계획 과정에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현재의 자리로 이건되었다. 당시 14세손 신갑철(申甲澈)[1911~1991]이 나서 신할의 묘소가 있는 곳이자 직계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로 옮길 수 있게 주도하였다.
1638년 신할 충신 정려가 세워진 이후부터 1982년 현재의 자리로 이건되기 전까지 많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중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평산신씨세보』에는 공주에 거주하던 신철희(申喆熙)[1836~1880], 신목균(申穆均)[1861~1914] 부자가 신할의 사적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고종 연간에 중창에 관한 정장(呈狀)을 예조에 올렸다는 기록과 1878년(고종 15) 정려를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할 충신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이익공 맞배지붕 양식이며, 화강암 기단에 둥근 초석과 기둥을 세웠으며, 사면에는 홍살을 둘렀다. 신할 충신 정려 앞면에는 ‘충정문(忠旌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내부 뒤쪽으로 신할 충신 정려를 1878년에 중건하였음을 기록한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신할 충신 정려 30m 앞에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이 신도비는 평산신씨의 가계와 임진왜란 때에 활약했던 신할과 형제들의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려가 바라다보이는 앞쪽 30m 정도 떨어진 언덕 북쪽에 1974년 서울 상도동에서 이건한 묘소와 묘비가 있다. 신할 충신 정려는 1997년 6월 5일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제26호로 지정되었다가 2024년 5월 17일 조례에 따라 공주시 유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할 충신 정려는 철폐될 위기에 있던 유적을 후손들이 지킨 것으로, 그들 집안에서 유적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유적의 이건이 단순히 아무 곳에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거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주군지』(공주군지편찬위원회, 1988)
- 『공주의 맥』(공주시·공주문화원, 1992)
- 『공주문화유적』(공주시·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 『문화유적분포지도』(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박물관, 1998)
- 『충남의 서원·사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999)
- 『공주 충·효·열 유적』(공주문화원, 2000)
- 『공주시지』(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 『신풍면지』(신풍면지편찬위원회, 2005)
- 『공주의 문화유산』-도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적(공주시, 2012)
- 『공주시지 2021』(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