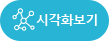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40081716 |
|---|---|
| 영어공식명칭 | cigarette folk song |
| 이칭/별칭 | 「담바고」,「담바구」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권현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서 담배를 소재로 하여 전해 내려오는 유희요.
「담바귀」는 담배의 생산국, 휴식 시간의 담배 피기, 소원 빌기 등을 노래로 풀어 내는 가창 유희요이다. 이를 「담바고」, 「담바구」라고도 한다.
2014년 간행한 『대구의 뿌리 달성』에 실려 있다. 이는 1994년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서 이연이[여, 당시 72세]로부터 채록한 것이다.
특정 형식이 없는 민요로서, '담바귀야' 하고 담배를 부르고 난 후 시어머니와 나누어 피면서 소원을 빌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담바귀야/ 대국에서 나온 담바귀야/ 어서어서 쌍걸음을/ 시오마시 줌채도 한 줌치 넣고/ 내 줌치에도 한 줌치 넣고/ 날멍걸멍 밭 매다가/ 너도 한대 나도 한대/ 그러고로 푸는 담배/ 소원을 빌아주소
우리나라에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광해군 때 담배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가 조선 사회에 막 퍼지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임금과 신하, 주인과 하인, 훈장과 서당 아이 등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함께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반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연례(煙禮)라고 해서 양반 사회는 물론 천민 사회에까지 상하 생활 예절로 담배 피는 예절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담바귀」는 조선 시대에 들어온 담배를 노래한 민요로서, 현재 전승 현장의 악화로 전승력이 약해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시청이 각 가정의 주요한 오락물이 되면서 「담바귀」와 같은 유희요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담바귀」에는 아낙네가 힘든 밭일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직접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담배와 더불어 살아온 서민들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담배를 통해 '소원을 빌어 주소'라며 긍정적인 기원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점이 「담바귀」의 특징적인 면이다.
- 『대구의 뿌리 달성』 1-달성을 되짚다(달성문화재단·달성군지간행위원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