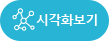| 항목 ID | GC40004434 |
|---|---|
| 한자 | 儒敎 |
| 분야 | 종교/유교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 지역 | 대구광역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구본욱 |
대구 지역의 유교와 그 특징.
대구 지역의 유학(儒敎)은 여말 선초에 시작되었으며 연경서원(硏經書院)을 중심으로 퇴계학을 중시하는 도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다.
유교(儒敎)는 고려 말 안향(安珦)[1243~1306]에 의하여 원나라에서 도입되었다. 이때의 유교, 즉 유학은 주자(朱子)의 성리학이다. 고려 말 대구 지역 유학자로는 채귀하(蔡貴河), 서균형(徐鈞衡)[1340~1391], 전백영(全伯英)[1345~1412]을 들 수 있다. 세 사람은 대구에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서 함께 관직 생활을 하였다. 모두 영천 출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와 교유하였으며, 서균형은 포은과 과거에 동방(同榜)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에 이르러 세 사람은 출처(出處)를 달리하였다. 채귀하는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절의를 지켰으며, 전백영은 조선의 조정에 참여하였다. 서균형은 전백영과 같이 조선의 개국을 지지하였으나 개국 1년 전에 타계하였다. 절의파(節義派)는 유학의 의리정신(義理精神)을 중시하였다면, 개혁파(改革派)는 유학의 경세론(經世論)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성종조에 서거정(徐居正)[1420~1488], 도하(都夏)[1418~1479], 양희지(楊熙止)[1439~1504]가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모두 경세론을 중시하였으며, 서거정은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역임하였다. 이후 대구 지역의 유학은 채귀하와 서균형, 전백영의 후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명종과 선조 대에 이르면 대구 지역에 하나의 학자 그룹, 즉 이전의 유학자와는 달리 수양을 중시하는 도학파(道學派)가 형성된다. 도학파에 속하는 사람은 이숙량(李叔樑)[1519~1592], 서형(徐浻)[1524~1575]·서식(徐湜)[1530~1593] 형제, 전응창(全應昌)[1529~1586]·전경창(全慶昌)[1532~1585] 형제, 채응린(蔡應麟)[1529~1584]·채응룡(蔡應龍)[1530~1574] 종형제, 정사철(鄭師哲)[1530~1593] 등이다. 도학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중시한 유학은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학문인 퇴계학(退溪學)이다. 이숙량, 전경창, 채응룡은 퇴계의 제자이고 그 외의 사람은 사숙제자(私淑弟子)이다. 모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전응창·경창 형제는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위 그룹을 대구 유학[성리학]의 1세대라고 하는데, 이후에 사승 관계를 중심으로 2·3세대가 양성되기 때문이다. 1세대 유학자는 1563년(명종 18)에 연경서원을 건립하여 대구 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교육받은 사람을 2세대라고 한다. 2세대는 서사원(徐思遠)[1550~1615], 손처눌(孫處訥)[1553~1634], 곽재겸(郭再謙)[1547~1615], 류요신(柳堯臣)[1550~1618], 이주(李輈)[1556~1604], 정광천(鄭光天)[1553~1594] 등이다.
2세대 유학자는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소실된 연경서원을 중건하였다. 1605년(선조 38)부터는 통강(通講)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강이란 “경전 등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매월 서원에 함께 모여 강(講)[암송]을 하여 스승의 평가를 받는” 유학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다. 대구 지역에는 이 당시의 통강을 기록한 『대구유현통강록(大邱儒賢通講錄)』이 전한다.
2세대로부터 교육받은 3세대는 265명에 이른다. 이 중 대표적인 사람을 열거하면 채몽연(蔡夢硯)[1561~1638], 채선수(蔡先修)[1568~1634], 채선견(蔡先見)[1574~1644], 손린(孫遴)[1566~1628], 류시번(柳時藩)[1569~1640], 류사온(柳思溫)[1573~1639], 도성유(都聖兪)[1571~1649], 도여유(都汝兪)[1574~1640], 도경유(都慶兪)[1596~1637], 서시립(徐時立)[1578~1665], 서사선(徐思選)[1579~1651], 이지영(李之英)[1585~1639], 이지화(李之華)[1588~1666], 최동집(崔東㠍)[1586~1661], 박종우(朴宗祐)[1587~1654] 등을 들 수 있다.
대구 지역의 유교[유학]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구 지역의 유학은 고려 말에 시작되었으며, 조선의 개국에 유학의 의리정신(義理精神)을 중시한 절의파와 경세론(經世論)을 중시한 개혁파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조선 후기에 이르면 퇴계학을 중시하는 도학파가 나타나서 교육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여 계보(系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행한 교육의 중심 장소는 연경서원이다.
셋째, 대구 지역의 유학은 이기론(理氣論) 등 이론보다는 수양을 중시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추구하였다. 또한 효행(孝行)이나 향약(鄕約) 등 실천을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이르도록 계승되었다.
- 구본욱, 「대구 지역의 퇴계학맥」(『영남지역 퇴계학맥의 전개』,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20)
- 장윤수, 「백불암 최흥원 가문의 학풍과 실천지향의 삶」(『한국학논집』5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 구본욱,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 지역 제3세대 유학자」(『조선사연구』28, 조선사연구회, 2019)